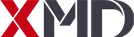해외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올해도 계속된다
2025.02.05 14:46-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3

2023년 기준 국내 럭셔리 시장 규모 22조, 세계 7위
신세계, 삼성 등 대형사 경쟁적 도입…직진출도 증가
[어패럴뉴스 이종석 기자] 해외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 시장이 대기업 산하에 소속되거나 직접 전개로 양분화되고 있다.
한국 법인 설립을 통한 직진출은 1991년 ‘샤넬’, ‘루이비통’ 등 럭셔리 브랜드를 시작으로 2020년대부터 붐이 크게 일어났다. 지난 5년간 알려진 수입 브랜드 직진출 사례만 해도 35개가 넘는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패션부문,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이 각각 전개했던 ‘톰브라운’, ‘셀린느’, ‘CK캘빈클라인’ 등이 꼽힌다.
최근에는 럭셔리를 넘어 가격대가 더 낮은 브랜드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팔라스’, ‘휴먼메이드’, ‘온’에 이어 올해 ‘스투시’가 직진출한다.
또 다른 한 축으로 대기업과 유통 계약을 맺는 브랜드 역시 확장세다. 삼성의 ‘가니’, 신세계의 ‘더로우’, ‘피비파일로’, LF의 ‘바버’, 한섬의 ‘키스’ 등이 있다.
이 중 직진출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로, 남·여성복 기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직진출과 유통사 전개 비중은 3:7 정도로 추정된다.
우선, 늘어나고 있는 국내 진출은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1년 OCED 기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지난해는 경제 규모 12위, 인구 3,000만 명 이상 기준 1인당 GDP 순위 7위를 기록했다.

백화점 확대 전략이 시장 키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럭셔리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1조9,900억 원으로 2022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소폭 증가한 2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지만, 컨템포러리·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패션 고관여층과 가치 소비 애호가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백화점 유통 역시 이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의 럭셔리·수입 컨템 조닝은 지속 확장 중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비식품 기준 매출 비중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33%를 기록, 2019년 대비로는 9.7%P 증가했다. 비중은 가장 높았으며 2위인 가정용품(12.6%)과 격차도 컸다.
이에 따라 수입 브랜드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직진출 법인이나 대기업을 통해 전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직진출은 LVMH·케어링 등 대형 자본이 있거나, 백화점 영업 등 현지 시장 이해도가 높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많다. 해당 업체들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시장에 정통하고 자본력이 있는 국내 패션 대기업과 유통 계약을 맺고 있다. 최근 계약을 맺는 브랜드들은 이른바 신명품으로 불리는 컨템포러리·디자이너 브랜드가 다수다.

대형사 수입 패션 비중 10~35%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원하면서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개했던 굵직한 수입 브랜드가 직진출하며 생긴 공백을 채우거나, 핵심 유통 채널인 백화점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을 확장 중이다.
내부적으로 수입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대비 작은 조직으로 인건비가 절감되며, 신규 브랜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인지도와 브랜딩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도 선호되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론칭한 브랜드는 신세계의 ‘에르뎀’, 한섬의 ‘아뇨나’, ‘리던’, LF의 ‘포르테포르테’, 코오롱FnC의 ‘N21’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수입 패션 매출 비중은 신세계 35%, 한섬·삼성 30%, 코오롱FnC 20%, LF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견기업인 아이디룩이 ‘산드로’, ‘아페쎄’, ‘마주’등을 전개 중이며, 신원은 지난해 ‘GCDS’, ‘까날리’를 들여와 수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이처럼 백화점·해외 브랜드·패션 대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수입 전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업체들은 202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거의 시장에서 사라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목표 매출이 100억 대 수준이면 중소기업, 300억 대 이상이면 중견·대기업이 운영, 그 이상이면 직진출하는 단계에 왔다”며 “수입 전문 기업들은 신예 및 스몰 브랜드들을 지속 발굴해, 대기업이나 직진출 전개 교체 시점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다음글 | 올해 새로 직진출하는 글로벌 브랜드 | 2025-02-05 |
|---|---|---|
| 이전글 |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주니어 시장을 잡아라 | 2025-02-05 |